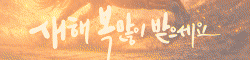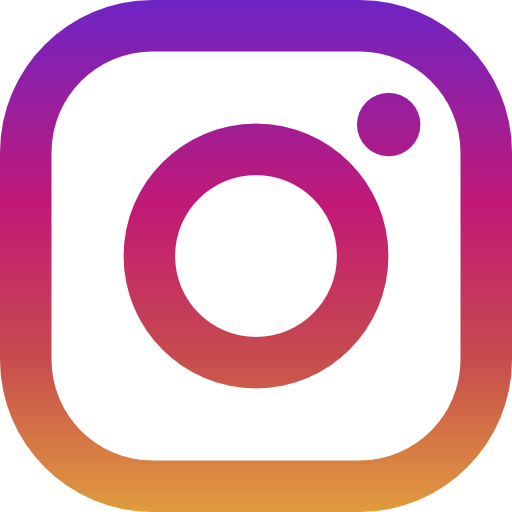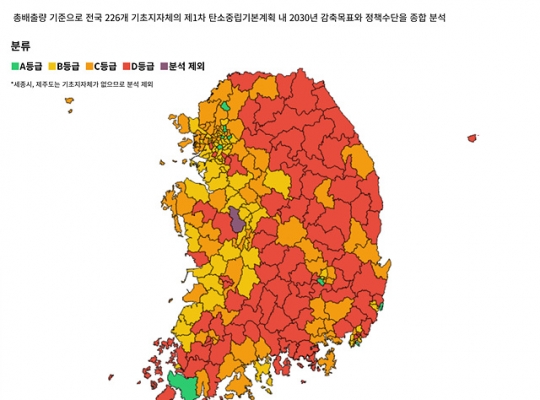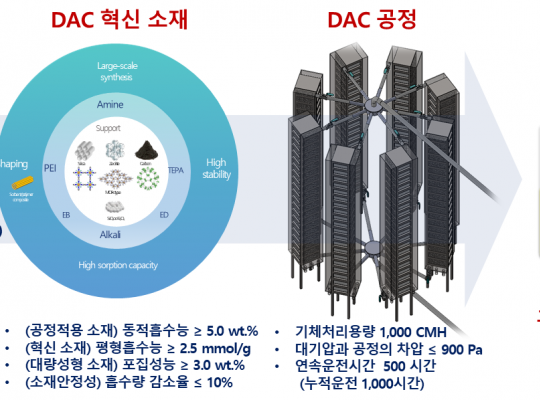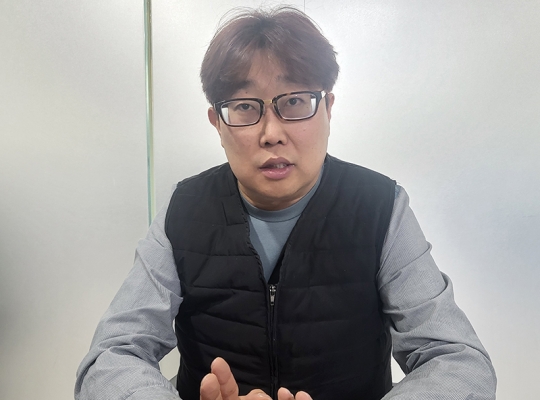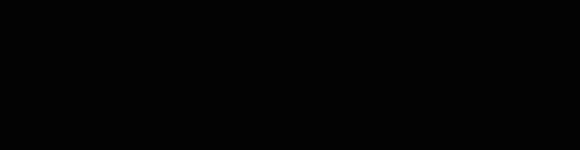유럽연합(EU)발 탄소세, 신(新)배터리법 등 ESG 통상규제가 물밀듯 몰려오는 상황이지만, 공급망 실사를 빠르게 정비하면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에서 양은영 KOTRA 실장은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의견을 듣고 제도를 보완해 세부지침을 정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한국기업들의 의견도 귀담아 듣겠다고 했다"며 "EU 역내 기업들만 익숙한 탄소배출량 계산식을 도입한다거나,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EU의 배출권거래제(ETS) 가격과 연동시키는 등 국내 기업에게 불리한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CBAM은 대상 제품에 내재된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도록 하는데, 공정별 배출 산정기준 등 세부방법이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다. 따라서 더 늦기전에 해당방식에 맞춰 기업의 생산시설이나 공정을 전면 점검하고,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길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품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최근 EU의 신 배터리법은 자원순환·안전보건·투명성을 목표로 배터리의 '설계 및 성능', 'ERP(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의 확대', '추적성 제고', '관련 제조 공급망의 사회적 책임(실사 및 제3자 검증)'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추진중"이라며 "데이터 관리와 함께 탄소집약도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투자도 함께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공급망 실사 과정에서 밸류체인 내 협력사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은 "공급망 실사의 세부적인 부분은 결국 법률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의거해야 하며, 이미 제정된 법률 및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의 사전 협의와 적법한 실사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컨퍼런스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업 자율에 맡겨지던 ESG가 점차 제도화·규범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ESG 수출규제들을 단순히 부담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기존 경쟁국 기업들을 제치고 시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