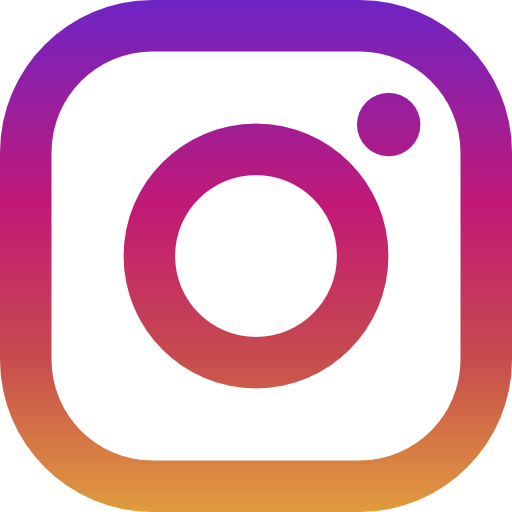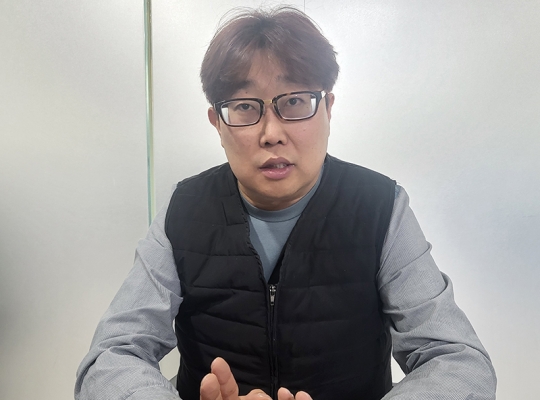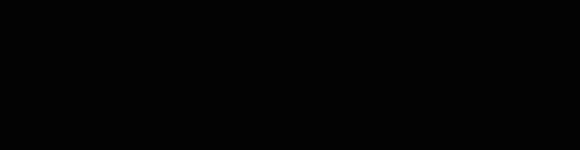기업부담 너무 과도하면 식량·보건위기 초래 우려

앞으로 동식물이나 미생물 유전정보에 대한 '관세'가 매겨질 전망인 가운데 세율과 범위를 놓고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 이익공유에 관한 합의문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DSI 합의문 초안은 DSI 활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일정량 거둬들이고, 이렇게 모인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투입하는 다자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생물의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DSI는 의약품, 식품, 섬유, 화장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 해마다 DSI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수익은 1조6000억달러(약 220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대부분 선진국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을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벌어간 것으로, 이에 대한 정당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제사회는 지난 2014년 나고야의정서를 채택하면서 유전자원의 무상접근과 무상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나고야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1대1로 양자간 협정을 통해 이익공유 합의를 보도록 했기 때문에 협상력이 떨어지는 개발도상국에 불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비영리적 목적이라는 명분 하에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DSI는 오픈액세스로 온라인 상에 공유되고 있어 애당초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이번 COP16에서 공개된 DSI 합의문 초안은 양자간이 아닌 다자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 기금을 만들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측은 DSI를 활용해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연매출 5000만달러(약 690억원) 혹은 자산규모 500만달러(약 70억원)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의 1~2%, 혹은 매출의 0.1~0.2%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전자원을 제공한 생태계 인근 원주민들과 지역사회에 DSI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세율이 너무 높고, 정보공개에 대한 리스크나 절차 상의 문제가 너무 과도해 기업들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류의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 개발중인 약품이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연구과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면서 진행이 더뎌질 수 있고, 결국 관련 제품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식량위기나 보건위기를 초래해 개발도상국에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DSI 합의안 마련 회담에 참관인으로 참여한 찰스 바버 세계자원연구소(WRI) 천연자원 거버넌스 및 정책 담당 이사는 AFP통신과의 "유전자원 정보로 제약회사가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그 정보를 제공한 이들에게 제대로 된 몫이 돌아가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없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번 총회에서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