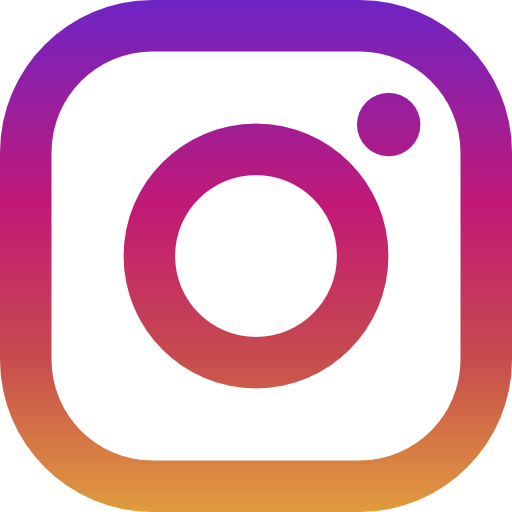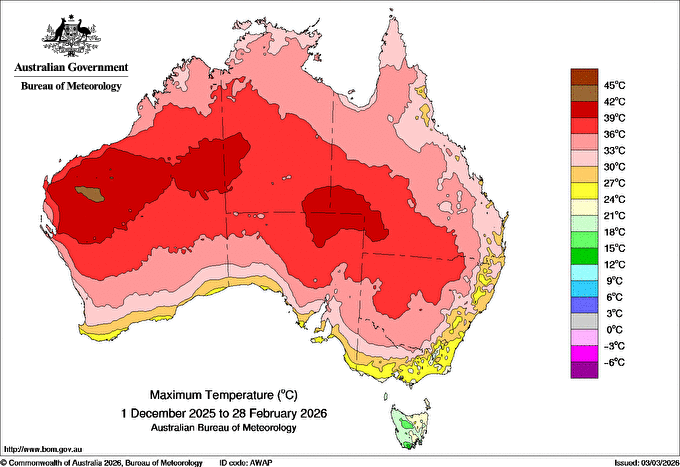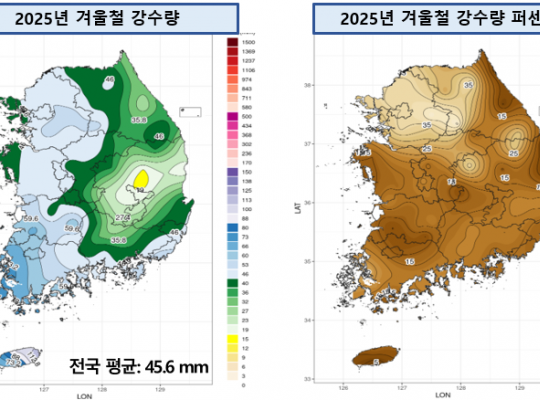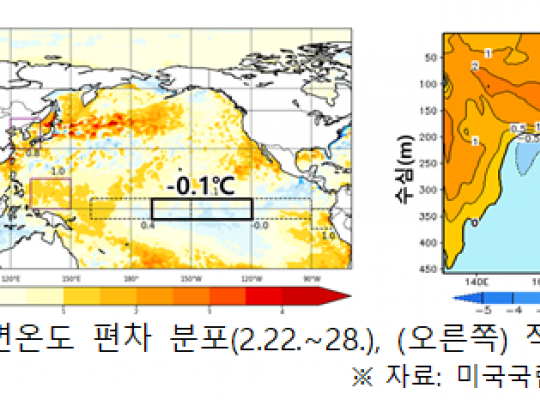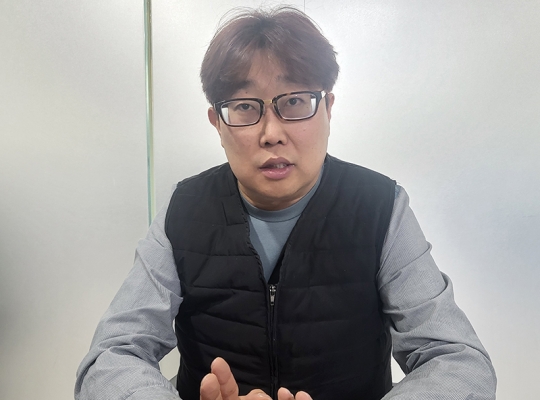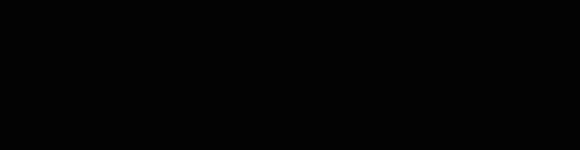날 것의 소설이다. 우리 시대의 초상을 생생하게 그린, 남도의 한(恨)을 문자 속에 담아내어 증언하는 비극적 서사를 읽으며 독자들은 고요히 전율하게 된다. 소설 속 화자의 감정이나 등장인물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면 그 슬픈 정서에 전이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책을 빨리 덮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상책이다. 하지만 우리는 <작별하지 않는다>와 가볍게 작별할 수 없다.
◇ 아마, 내가 살리러 왔어
소설 속 화자 '나'(경하)는 친구 인선의 부탁으로 제주도의 인선의 집으로 찾아간다. 입원한 인선은 한 달 간 집을 비웠고 앵무새 '아마'는 아마 목말라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눈 내리는 밤 인선의 집에 도착하자 앵무새가 앉는 횃대는 텅 비어있고 새장 안의 물그릇도 비어 있다. 아마가 그 옆에 쓰러져있다. '내가 살리러 왔어. … 움직여 봐. 내가 구하러 왔어.' 경하는 아마를 고이 감싸안고 상자 안에 넣어 언 땅을 판 후, 구덩이에 매장해 장례를 치른다.
"희끗한 표면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두 손으로 흙을 떠 넣는다. 좀 전에 파냈던 흙을 삽으로 퍼서 덧쌓고, 힘껏 손바닥으로 다져 작은 봉분을 만든다." 155쪽
아마와 이별하는 성스러운 의식, 이 장면은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암시하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작별의 방법일지도 모른다.
앵무새의 이름은 '아마'다. 한국어 '아마'의 어감과 의미는 우리에게 기묘한 울림을 준다. 과거를 가리키는 걸까? '아마, 사실이 아닐 거야.' 미래의 어떤 날에 대해 신호를 보내는 걸까? '아마, 그날이 올 거야.' 진실이 밝혀지는 날, 아니면 유해들을 낱낱이 되찾아 정성껏 매장하는 그런 날 말이다.
◇ 작별하지 않는다
숲 속에 있는 인선의 집에는 공방이 있다. 목공 작업실 내벽에는 서른 그루 남짓한 통나무들이 차곡차곡 세워져있다. 공방 외벽에 쌓여져 있는 것까지 합하면 백 그루가 넘는다. 경하는 인선에게 함께 무언가를 해보자며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했었다. 함께 통나무를 심어 먹을 입히고, 눈이 내리길 기다려 그걸 영상으로 담아보면 어떻겠느냐고. 인선이 먼저 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얀 눈이 덮인 검정색의 등신대는 단지 흑백의 이미지 대조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자아내는 표면효과를 일으킨다. 등신대(等身大)는 사람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를 말한다. 사람 크기의 검은 나무들이 찬 눈을 맞고 있다. 뿌리와 가지들이 잘린 채 검은 형상으로 서 있다. 망자들과 망자들의 죽음을 추념하는 것일까. 언젠가 인선이 경하에게 자신들의 프로젝트의 이름을 묻자 경하는 이렇게 대답한다. "작별하지 않는다."(192쪽)
소설의 처음부터 나무 이미지가 등장한다. 경하는 꿈을 꾼다. 산등성이에서 들판 아래쪽까지 이어져 있는 수 천 그루의 통나무들이 심겨져 있다.
'침목처럼 곧지 않고 조금씩 기울거나 휘어 있어서, 마치 수천 명의 남녀들과 아이들을 어깨를 웅크린 채 눈을 맞고 있는 것 같았다.' 9쪽
공방 벽에 기대어있는 검은 통나무들을 바라보는 경하의 마음이 일렁거린다.
"조금씩 다른 농도로 칠해진 그 검은 나무들이 어떤 말을 하는 것 같다고 나는 느낀다. … 칠하지 않은 생나무들은 표정도 진동도 없는 정적에 잠겨 있는데, 이 검은 나무들만이 전율을 누르고 있는 것 같다." 145쪽
소설 말미에서는 나무들의 침묵이 말한다.
'무엇이 지금 우릴 보고 있나, 나는 생각했다. 우리 대화를 듣고 있는 누가 있나.
아니, 침묵하는 나무들뿐이다.
이 기슭에 우리는 밀봉하려는 눈들뿐이다.'320쪽
◇ 아무도 믿지 않는다
나무들은 절멸 당했다. 그 나무들은 검게 칠해져 있고 눈도 입도 가려져 있다. 절멸을 목적으로 진행된 사냥을 통해 학살된 양민들, 그들의 시신은 집단으로 매장되고, 갱도에 묻히기도 하고, 바닷물에 떠내려갔다. 그리고 누구도 그 일을 입에 떠올릴 수 없었고, 누군가 말하여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들은 봉인되고 오래 잊혀졌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브리엘 G. 마르케스(Gabriel Garcia Marquez)의 <백년 동안의 고독>에도 대학살 이야기가 등장한다. 소설의 무대가 되는 마을 마콘도에 미국의 바나나 회사가 들어서면서 현지 주민들은 착취적인 노동 조건 속에 일하게 된다. 벌목도를 휘두르는 직업적인 암살자들이 노무관리를 하고, 위생과 노동 조건이 최악이었으며, 심지어 현금이 아니라 회사의 구매소에서나 햄을 살 수 있는 배급표를 임금으로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임금과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대파업에 나서고, 이에 회사는 군대를 동원해 시위 진압을 시도한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대는 역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을 포위한 채 기관총을 난사한다. 3000명이 죽임당했다. 이 이야기는 콜롬비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학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살육당한 시신들은 200량 길이의 기차에 실려 한밤중에 어디론가 실려간다. 시체 더미 속에서 의식을 회복한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는 기차에서 뛰어내려 마콘도로 되돌아간다. '학살이 일어났던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동생을 만나 그 사실에 대해 말한다.
"그는 형의 얘기를 듣고도 학살 사건이라든가 시체 더미에 묻혀서 기차에 실려 바다로 갔다는 악몽 같은 여행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문학사상사, 344쪽
아무도 말할 수 없었고, 아무도 믿지 않았다. "낙인찍힌 유족들도, 입을 떼는 순간 적의 편으로 낙인찍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침묵했으니까." 317쪽
알다시피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도의 4.3이라는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s)을 다룬다. 한강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죽음 서사에 집착하고 대학살과 국가 폭력이라는 예민한 주제를 건드리는 걸까? 마치 희생자 가족의 트라우마를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고 여겨질 정도다. 진실이 더는 은폐되지 않기를, 그 비극이 망각 속에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일까. 어쩌면 소녀 한강이 그 죽음 사건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발견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더는 버려진 고독이 되지 않도록, 기억을 통해 연대하면서 펜을 들고 문학으로 기억의 등신대를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일 게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를 어떤 곳으로 데려간다. 인선은 경아에게 함께 '나무들을 심을 땅'으로 데려간다. 집 가까이 숲 속에 있는 땅인데, 두 사람은 눈과 어둠 때문에 힘겹게 다가간다. 건천을 지나야 하고, 촛불을 켜야 한다. 종이컵 속의 촛불이 깜박이더니 꺼져버린다.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성냥을 그었다. 불붙지 않았다. 한번 더 내리치자 성냥개비가 꺾였다. 부러진 데를 더듬어 쥐고 다시 긋자 불꽃이 솟았다. 심장처럼, 고동치는 꽃봉오리처럼."325쪽
나무들을 심을 땅이 필요하다. 촛불도 필요하다. 길을 여는, 어둠을 밝힐, 함께 기억하고 추념하는.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