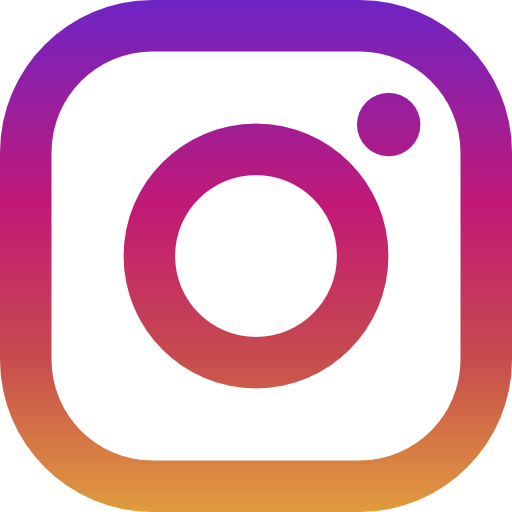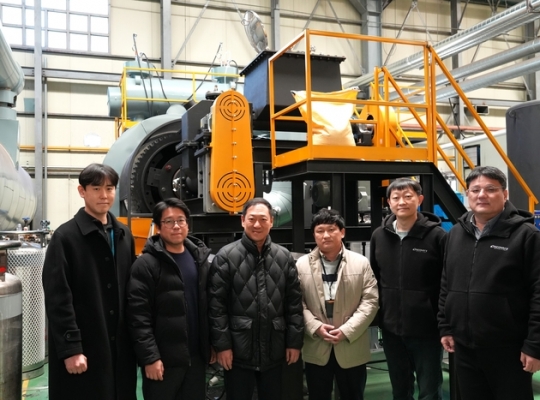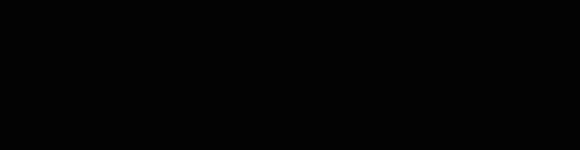나무로 울창해야 할 숲. 그런데 숲이 사라지고 있다. 나무들이 모두 잘려나간 숲은 흉측한 민둥산으로 바뀌고 있다. 이른바 '싹쓸이 벌목'의 결과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싹쓸이 벌목'을 최초 보도한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나무를 군데군데 베는 솎아베기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면적에 있는 나무를 모조리 베어버리는 것"이라며 "산림청에 지역별로 벌목을 할당한데서 이같은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숲을 가꾸는 벌목이 아니라, 예산에 맞춘 벌목의 결과라는 얘기다.
'싹쓸이 벌목'으로 수령이 30~40년에 이르는 나무들도 싹뚝싹뚝 잘려나갔다. 이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우려도 크다. 장마 등으로 산사태 가능성도 있고, 나무를 모조리 베어버린 탓에 오히려 숲의 다양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벌목된 나무도 문제다. 국산 목재 이용률 중 고품질 재료로 쓰이는 건 고작 12.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저품질 재료로 소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병성 목사는 "지난 2014년 산림청이 수종별로 벌목이 가능한 수령 벌기령을 완화하면서 병아리에 불과한 나무들도 벌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목재 공급량은 안정됐지만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했다. 저품질 재료로 소모되는 목재는 탄소배출량을 오히려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2014년부터 어린 나무를 벨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는데 왜 유독 올해 민둥산이 많이 보이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올 1월 산림청이 발표한 30년동안 '30억그루 나무심기' 정책을 펼친데서 찾을 수 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산림청은 산림의 양을 늘려 탄소흡수율을 높인다는 취지아래 이같은 정책을 수립했다. 또 이를 통해 국내 목재산업 규모를 4조원에서 60조원까지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국내 산림에서 더이상 나무를 심을 자리가 없다는 것. 이에 산림청은 기존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재조림'하는 방식으로 '30억그루' 나무심기를 선택했다. 수령이 오래된 나무 1그루를 베어내면 그 자리에 묘목 10그루를 심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산림청은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한다"면서 "나무의 체적이 늘면서 면적 당 개체수가 줄고 산림 전체 탄소흡수량은 적어진다"고 주장했다. 30년 이상의 나무는 탄소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어린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2014년 네이처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나무는 수령이 오래될수록 체적 성장률이 증가하면서 탄소흡수량도 덩달아 높아진다. 즉, 대부분의 수종에서 크고 오래된 나무는 작은 나무에 비해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한다고 돼 있다.
진정 숲을 못본 건 어느쪽일까? '싹쓸이 벌목'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산림청에게 민·관협의회 결성 및 계획 재검토 제의했고, 이에 산림청은 지난 6월 3일 이를 수락하고 재조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