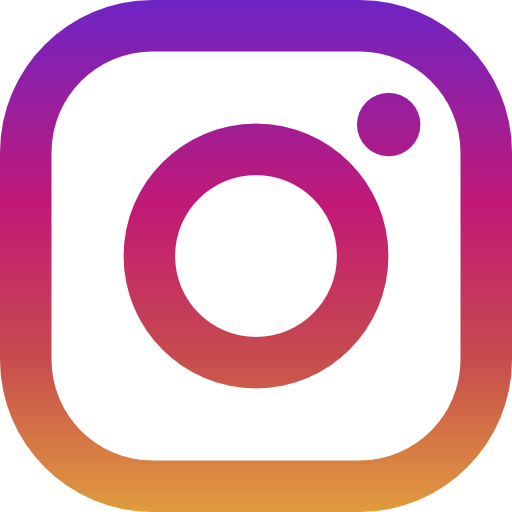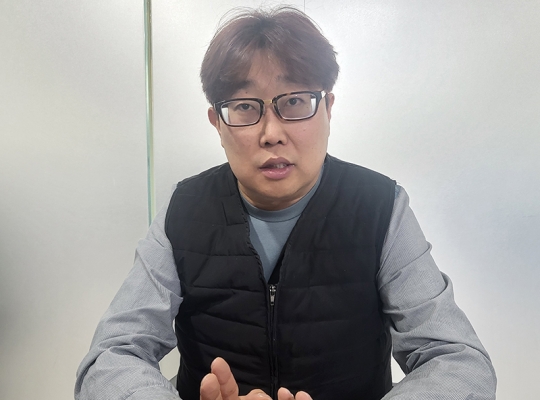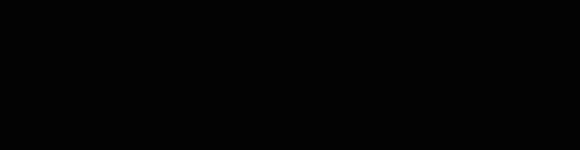유럽 등 선진국은 '채비' 완료...국내는 걸음마
한번 생산되면 사라지는데 500년 이상 걸리는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 참혹하다. 대기와 토양, 강과 바다. 심지어 남극과 심해에서도 플라스틱 조각들이 발견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 지구를 뒤덮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제적인 플라스틱 규제가 마련되려는 시점을 맞아, 플라스틱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보고 아울러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기업을 연속기획 '플라스틱 지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현재 초안이 공개된 '국제플라스틱 협약'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면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게 된다. 한번 사용하고 버렸던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을 위한 자원이 되고,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가녹색기술연구소(NIGT)가 추산한 2022년 전세계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규모는 59조원이다.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도 연평균 6%씩 성장하고 있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2026년에 2조6596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대기업부터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재활용 시장에 막 뛰어들거나 사업을 타진하고 있는 수준이다. 제도적 뒷받침도 미흡하다.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가 되려면 시장 수요가 받쳐줘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않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크게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으로 구분된다. 물리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잘게 파쇄해 펠릿으로 만드는 방식이고, 화학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열이나 화학물질을 이용해 원료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2가지 방식 가운데 삼성증권 ESG연구소는 향후 10년간 물리적 재활용의 점유율이 80~90%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플라스틱 협약초안에도 물리적 재활용 방식에 방점이 찍혀있다.
◇탄소중립·오염관리···'물리적 재활용'에 방점
물리적 재활용은 공정이 단순하고 탄소저감 효과가 크다. 네덜란드 조사기관 CE델프트에 따르면 페트(PET) 1톤을 물리적 재활용 방식으로 활용할 경우 이산화탄소 2.4톤을 저감할 수 있다. 약점으로 꼽히던 재활용 횟수에 따른 품질저하 문제도 계속 개선되면서 3~4회 수준에서 7~8회까지 늘어났다.
반면 화학적 재활용 방식 가운데 하나인 '열수처리'의 경우 160~240℃의 고열과 압력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고, '가스화' 방식의 경우 1000~1500℃의 고열로 합성가스를 만들어내야 하므로 에너지가 많이 소요된다. 이에 유럽 재활용 시장에서는 화학적 재활용을 배제하고 있고, 세계자연기금(WWF)은 기존 플라스틱 대비 탄소배출량을 최소 20% 줄이고, 재활용이 어려울 정도로 품질이 떨어지거나 여러 재질이 섞여 선별이 어려운 복합재질에 한해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기도 했다.
미국 환경청(EPA)도 화학적 재활용은 '재활용'이 아닌 '제조'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물리적 재활용의 경우 최종 소비자가 사용한 뒤 버린 플라스틱 제품을 수거해 그대로 다시 쓰는 'PCR'(Post-Consumer Recycled) 플라스틱으로 순환경제의 고리를 완성할 수 있다면, 화학적 재활용은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탄소중립에 저해된다. 또 물리적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오염물질 유출이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지만, 화학적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폐기물 누출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 물리적 재활용 '불모지'···수요 확대 '시급'
이처럼 주요국들은 '물리적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국내는 물리적 재활용 시장이 아직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다. 대표적인 소비재 플라스틱 재질인 페트만 놓고 보더라도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인증을 마친 업체는 국내에서 알엠 화성공장 단 1곳뿐이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재활용 플라스틱은 연간 1200톤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연간 80만톤의 페트 플라스틱 가운데 재생 플레이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양은 연간 25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원료에 대한 수요가 없는 탓에 수거된 페트병의 대부분은 열분해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알엠 김자원 이사는 "우리가 생산하는 재생원료를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곳은 코카콜라와 산수음료 단 2곳뿐"이라며 "국내에서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한다고 해도 수요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때문이다. 올 8월 기준 재생 페트 플레이크 평균가격은 1kg당 1008.6원이었다. 페트병 무게가 16g에 불과한 제주 삼다수 500ml 제품의 가격이 1100원이다. 재생원료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꺼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재생원료 수요가 확대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관련업계는 입을 모은다. 환경부는 페트 1만톤 이상을 제조하는 기업에게 재생원료 3%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겐 권고만 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사용할 의무도 없고, 채산성도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할 때 최소 15% 이상을 재생원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2025년부터는 재생원료 비중이 25%, 2030년부터는 최소 50% 이상 사용하도록 했다. 영국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30% 미만일 때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자와 수입자에 대해 1톤당 200파운드(약 33만원)를 과세하고 있다.
내년 2월부터 재생 페트를 생산할 계획인 수퍼빈의 김정빈 대표는 "기본적으로 재활용 시장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로 관여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재생원료 투입 의무화 비중을 높여야 물리적 재활용 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원료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기업들은 국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