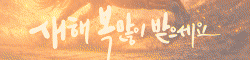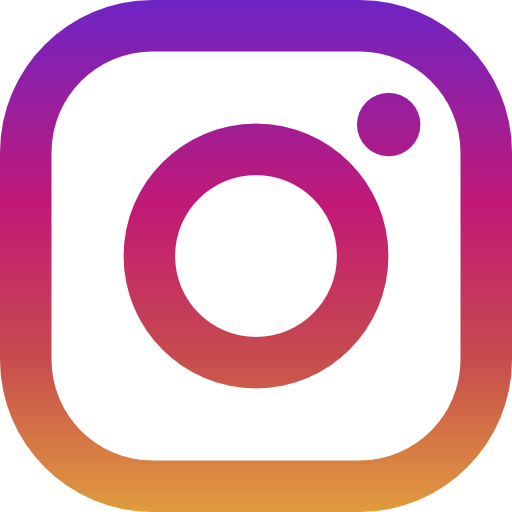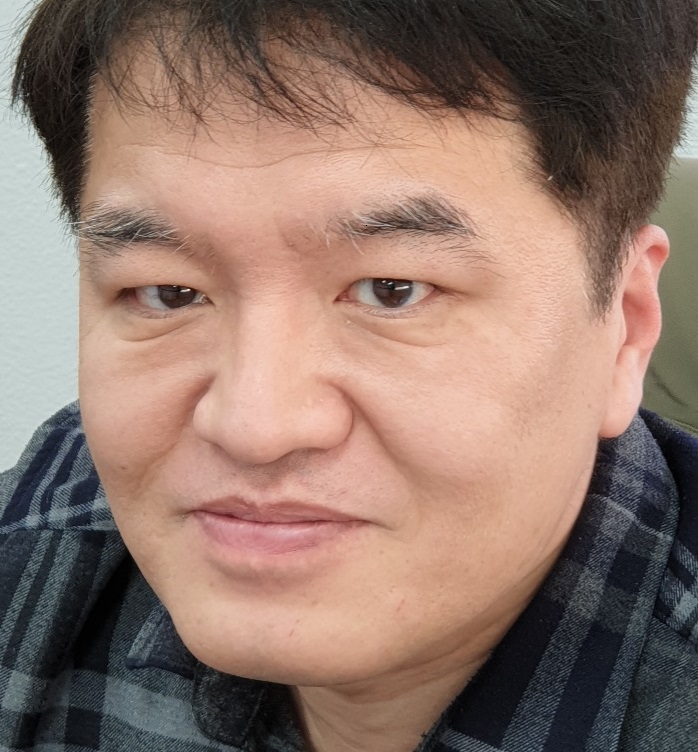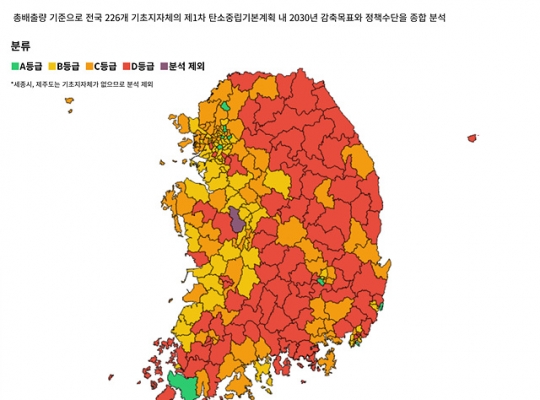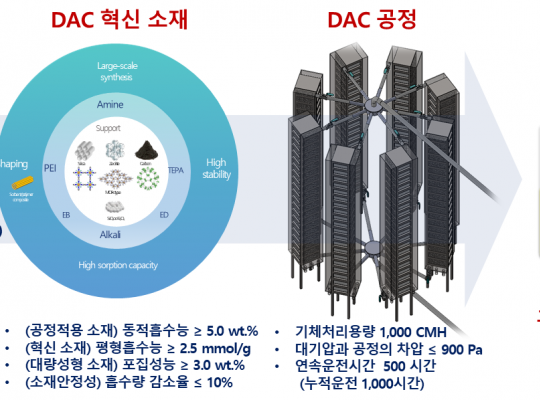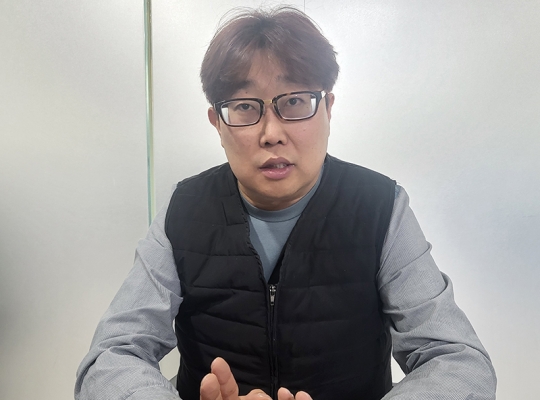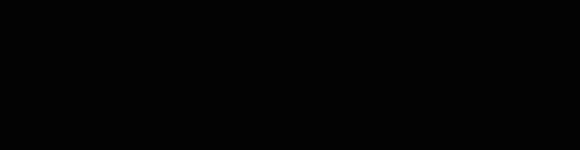'배송 경쟁력' 확보만큼 ESG 경영 선행돼야

신세계그룹이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 신세계, 쿠팡이 삼각축을 이루는 '3강 구도'로 재편됐다. 플랫폼 강자 '네이버', 전통적인 유통명가 '신세계', 로켓배송으로 급성장한 '쿠팡' 등은 '이커머스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물류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쿠팡의 물류센터 화재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물류경쟁력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간과하면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 인수로 이커머스 2위에 오를 신세계는 온라인 물류센터에만 4년간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신세계그룹의 오프라인 거점도 온라인 물류 전진기지로 활용해 물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커머스 시장경쟁력이 물류 즉 배송에서 판가름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셜커머스로 시작한 쿠팡은 '로켓배송' 등 차별화된 물류시스템으로 급성장했다. 마켓컬리 역시 '새벽배송'이라는 물류 경쟁력으로 성장한 사례다. 이에 이커머스 기업들은 물류와 배송 경쟁력을 성장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투자에 나서고 있다.
업계 1위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다. 네이버는 최근 CJ대한통운과 손잡고 축구장 5개 크기의 온라인 전용 풀필먼트 센터를 마련했다. 오는 8월에는 냉장·냉동 등 저온보관 상품에 특화한 콜드체인 풀필먼트 센터를 가동할 예정이다. 쿠팡 역시 올해 1조원이 넘는 물류시설 투자계획을 내놓으면서 '배송 절대 강자'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배송만큼 중요한 한가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화재 사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ESG 경영을 멀리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외면당한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노동자 사망사고 등으로 사회적 책임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은 쿠팡은 이번 화재로 큰 위기에 처한 상태다. 물류센터는 화재에 취약한데도 고장난 스프링쿨러를 방치했고, 근무자들의 지속되는 위험경고도 무시해온 것으로 사고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물류센터 직원들의 휴대폰 반입을 금지해 화재신고도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게다가 화재 발생 당일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등기이사를 사임했다. '글로벌 경영'을 사임 이유로 내세웠지만, 누가봐도 '책임 회피'로 읽힌다. 쿠팡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경영에 격분한 소비자들은 결국 불매운동으로 응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화재사건 전후 쿠팡 이용자를 비교하면 그대로 드러난다.
빅데이터 플랫폼기업 아이지에이웍스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초 약 1021만명이 이용하던 쿠팡앱 사용자는 화재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 20일 817만8963명으로 200만명 이상 감소했다. 특히 MZ세대(1980~2000년대초 출생) 사용자는 지난 7일 대비 22만2193명 이탈하며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가치있는 소비'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과거처럼 "이미지는 악화됐더라도 제품이나 배송 경쟁력만 있으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네이버나 신세계도 '빠른 배송'으로 속도경쟁에 몰두할 경우 쿠팡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진정한 ESG 경영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진정한 강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황산 아트앤북 대표는 최근 뉴스트리 칼럼에서 "기업이 ESG를 실천하면 기업에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이를 성실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에너지와 인력이 투입된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일종의 비용 증가로 인식되어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이익이 되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발판이 된다. 만일 이 가치를 무시하면 소비자에게서도 외면당하고 금융시장이나 국제적 거래에서 더이상 설자리가 없게 될런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