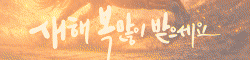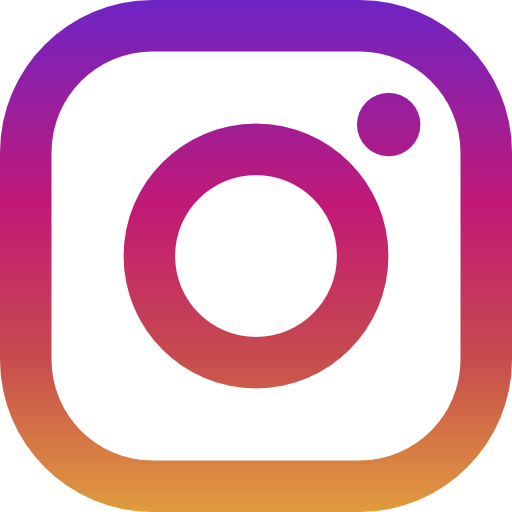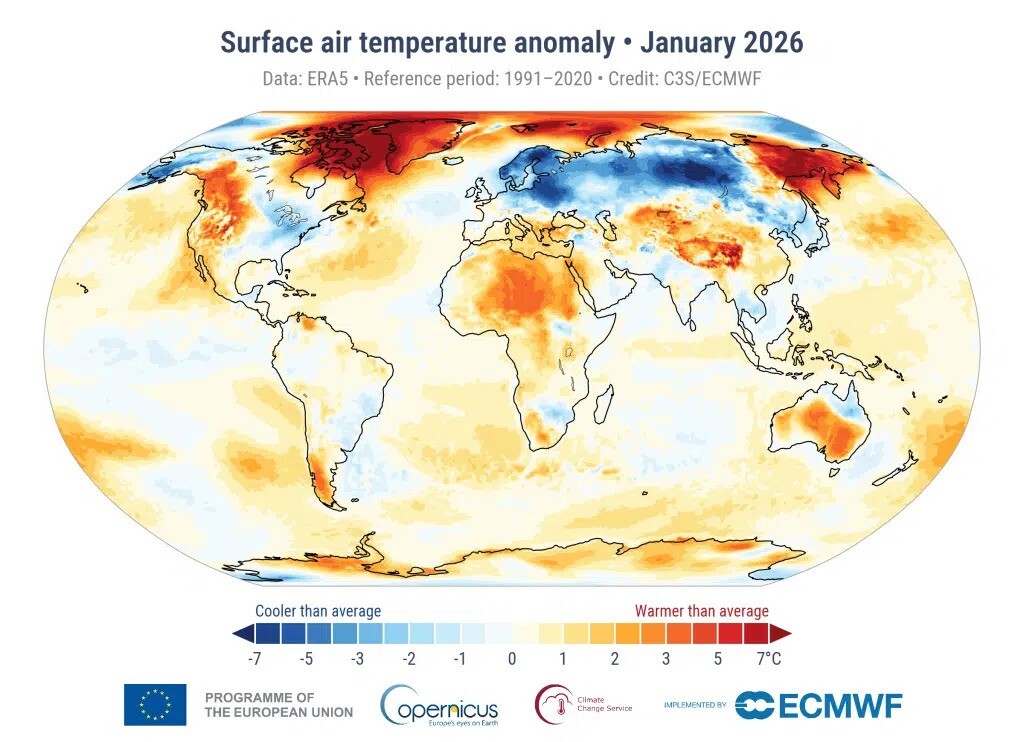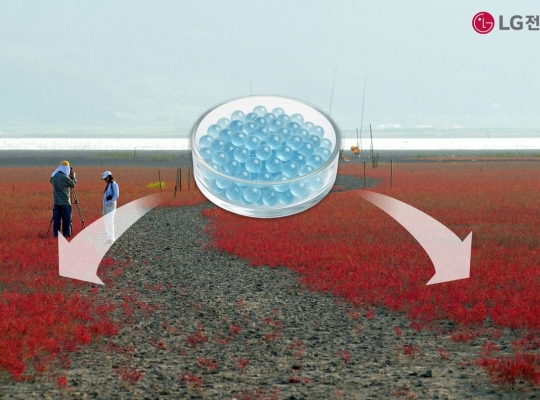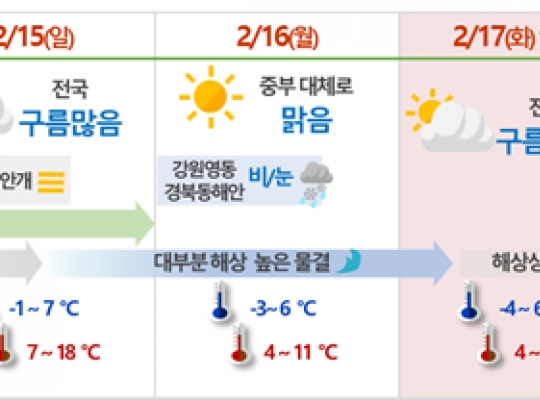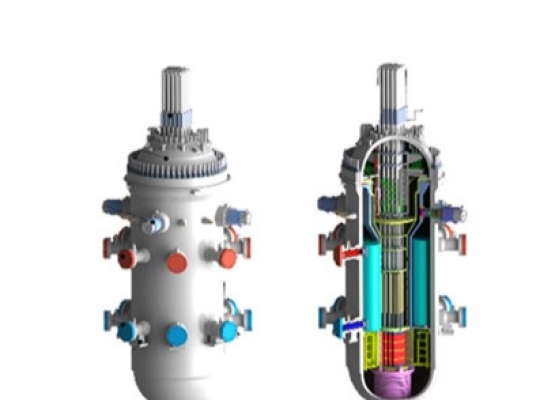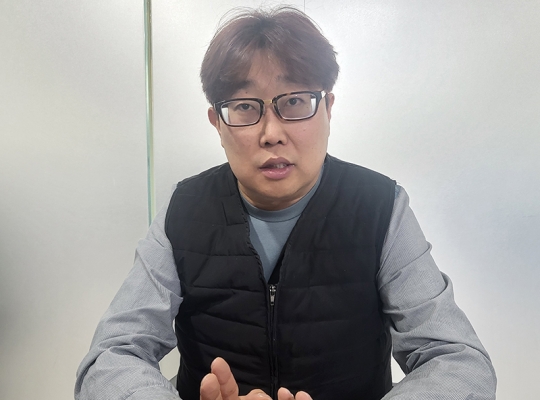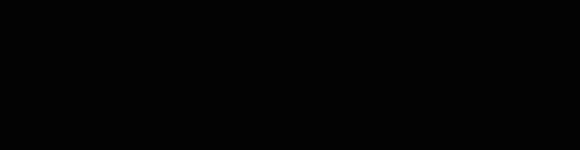제주에는 '새섬'이 있다.
서귀포항구 앞에 우뚝 서있다. 왜 새섬이라 할까. 새가 많이 살아서일까. 대부분 그리 생각할 것이다. 아니다. 제주사람들의 생활상이 숨어있다. 제주에는 초가지붕이 많았다. 초가지붕을 지으려면 새가 필요했다. 새란 무엇인가. 초가지붕을 이어주는 띠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억새라 할 수 있다. 새섬에는 새가 많이 자생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새섬이다. 한문표기는 초도(草島), 모도(茅島)이다.
새섬에는 재미있는 전설도 있다. 한라산이 폭발했다. 그때 바윗덩어리가 날아와 섬이 됐다고 한다. 한라산 화산활동의 위력을 알 수 있다. 새섬에는 조선조 중엽부터 사람이 살았다. 척박한 땅을 개간해 농사를 지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사람이 살았다. 지금은 무인도다.
새섬은 서귀포항과 가깝다. 가까워도 가기가 불편했다. 새섬으로 가려면 오래 기다려야 했다. 간조 때까지 기다려 새섬목을 건너야 했다. 이런 불편은 2009년에 막을 내렸다. 서귀포항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새연교가 건설됐다. 새연교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다리라는 뜻이다. 국내 최초로 외줄케이블 형식의 사장교로 만들었다. 길이 169m의 짧은 다리다. 짧지만 이름다움이 뛰어나다. 밤에는 불을 밝혀 빛의 향연을 보여주고 있다. 새연교는 새섬을 관광명소로 만들었다. 사람들이 편히 새섬을 찾게 만들었다. 새섬의 고요함을 느끼게 해줬다.

새섬의 산책로는 1100m의 짧은 길이다. 쉬엄쉬엄 걸어도 20분이면 한바퀴를 돌 수 있다. 길이가 짧다고 우습게 보지마라. 볼거리가 많다. 산책길도 다양하게 구성됐다. 새섬광장, 갈대숲, 연인의 길, 언약의 뜰, 선라이즈 광장, 바람의 언덕 등 8개 주제로 손님을 맞고 있다. 걷기에도 편하다. 나무 데크가 발걸음을 가볍게 해준다. 자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흙길도 산책객을 반긴다. 가슴이 뻥 뚫리는 해안도로는 시름을 잊게 한다.
새섬에는 새만 많은 것이 아니다. 맥문동, 인동초, 부처꽃, 해국, 참나리, 털머위 등 야생 초화류가 각각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야생초만 있을까. 다양한 나무친구들이 시원함을 제공해준다. 동백나무가 붉디붉은 꽃을 훈장처럼 달고 있다. 쥐똥나무, 소나무, 굴거리나무, 돈나무, 사철나무, 팔손이나무 등 10여종이 사시사철 푸르름을 제공해 주고 있다.
꽃과 나무가 있으면 새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새섬에는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이 둥지를 틀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물수리도 안식처로 삼고 있다. 바닷새들도 풍부한 먹잇감을 벗 삼아 섬 생활을 즐기고 있다. 바다직박구리, 가마우지, 갈매기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새섬의 산책길은 새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나무와 야생초와 새들의 지저귐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연의 원초적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낙원이 어디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새섬이 바로 낙원이라 느낄 것이다. 새섬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내세우지 않는다. 자신을 인간의 발밑에 두고 또 다른 아름다움을 제공해준다.
새섬에서 바라보면 제주의 자랑거리인 섶섬, 문섬, 범섬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섶섬은 새섬에서 바라볼 때 제일 왼쪽에 있다. 나무가 많아 섶섬이라 부른다. 섶섬에는 파초일엽이라는 귀한 식물이 자라고 있다. 파초일엽 자생지로 천연기념물 제18호다. 문섬은 3섬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 문섬은 아무 것도 자라지 않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범섬은 가장 오른 쪽에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섬의 모습이 범과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범섬은 고려 공민왕 23년(1374)에 몽골군이 침범했을 때 최영 장군이 그들을 물리친 역사적 장소이다. 문섬, 범섬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천연기념물 제421호이다.
새섬은 제주 올레길 6코스의 구간이다. 무념무상으로 걷다 휴식을 취하고 싶은가. 고민하지 마라. 새섬에 몸을 맡겨라. 그대를 포근히 감싸줄 것이다.


글/ 김병윤 작가
춘천MBC 아나운서
주간야구 기자
내외경제(현 헤럴드경제) 기자
SBS 스포츠국 기자
저서 <늬들이 서울을 알아>
<늬들이 군산을 알아>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