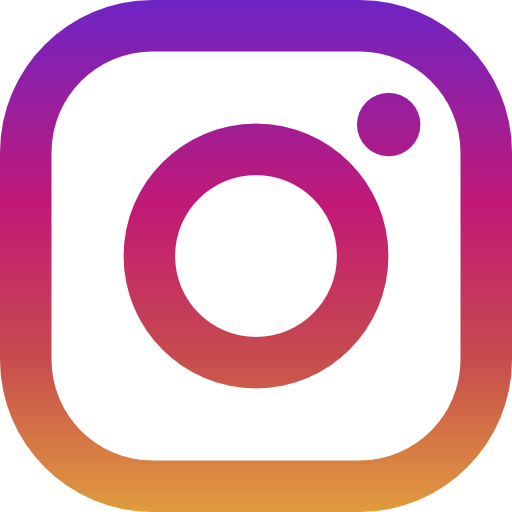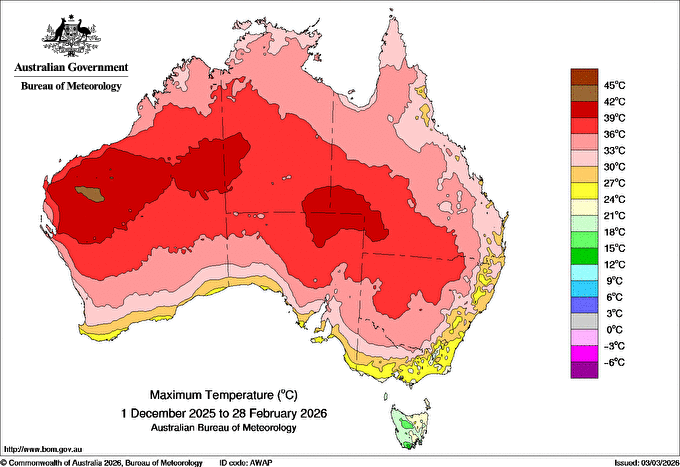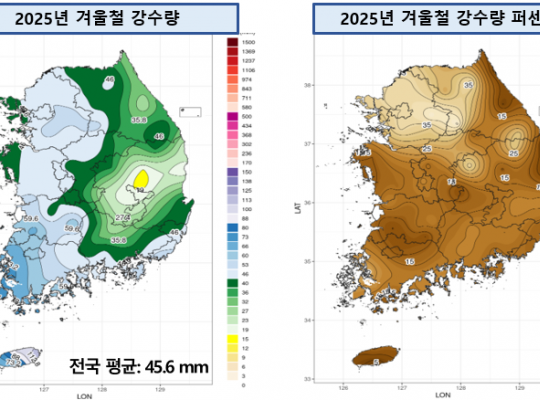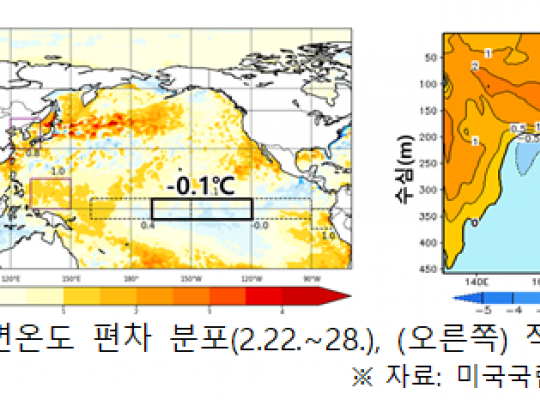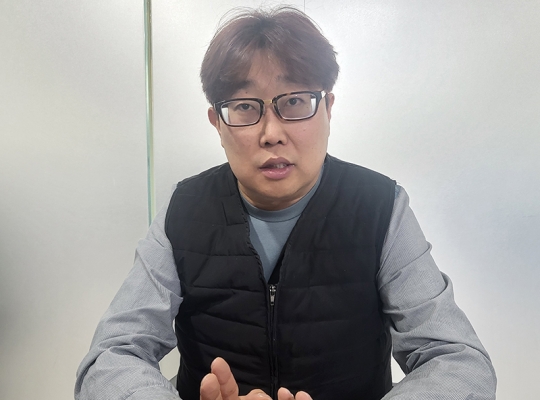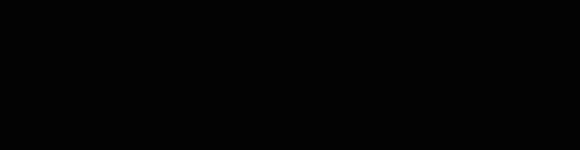우리는 누군가의 진심을 갈망한다. 그리고 진심에 매료된다. 미심쩍은 진심이라도 진심의 형식을 취하면 그 진심에 맞추어준다. 이것이 진심의 법칙이자 주술이다.
2023년 현대문학상 수상작인 안보윤의 '어떤 진심'은 진심의 어두운 현상학을 잘 보여준다. 소설 속 등장인물인 H 목사라는 이름의 종교인은 진심을 담아 말하며 신도들에게 호소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사과한다. 신도인 유란의 엄마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자기 비하와 고뇌의 참회조차 서슴지 않는다. '절망에 잠식당한 얼굴로 가슴을 쾅쾅 두드리며 진심을 담아 사과'한다.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받아들여진다. 소설은 그 사과를 이렇게 묘사한다.
'사과받은 이가 진저리를 칠 때까지, 더 이상 사과받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실행하고 말 때까지 집요하게 반복되는 사과'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작고 미력한 존재라 미안합니다. … 사과받는 신도들이 진저리를 칠 때까지, 더 이상 사과 받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실행하고 말 때까지 집요하게 반복되는 사과였다."
그의 말은 진심 어린, 언제나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진심은 사람들을 움직였다. 소설은 그런 진심을 '어떤 진심'이라고 부른다. 진심처럼 보이는 진심, 진심의 문법을 지닌 어떤 것, 집요한 반복과 애절함으로 사람들을 빨아들이고 움직이는 정체 모를 주문과도 같다는 것일까.
"엄마 좀 도와줘. 유란아. 제발 한 번만. 유란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채감에 시달렸다. … 비난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다음, 또 다음 부탁이 유란을 옭아맸다."
유란의 엄마 역시 언제나 딸에게 그런 방식으로 부탁했다. 명령조가 아닌 호소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유란은 뿌리치지 못한다.
·
소설 속 화자 유란은 엄마를 따라 어떤 종교단체의 건물 안에서 산다. 그는 '성장한 열매'가 되어 포교 활동을 한다. 유란은 무료 과외를 해 주면서 이서를 씨앗으로 포섭하여 발아하게 한다. 유란은 진심을 가지고 이서를 돕는다. 둘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고 이서는 유란을 언니로 부른다. 유란은 이서에게 이렇게 말한다. "정말 열심히 할게. 나 좀 도와줘, 이서야." 엄마가 유란에게 말하는 방식, H가 신도들에게 말하는 방식이 재현된다.
이서는 유란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신뢰한다. 그리고 열매로 자라난다. 유란의 마음속에 맴돌던 의문은 심리적 무거움이 된다. "유란은 그런 이서의 의존과 맹목을 부담스러웠다." 유란은 계속 '진심'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진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마치, 진심 같았다.… 어떤 진심은 진심이라서 한심했다. 어떤 진심은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 속 복숭아처럼 쇄 냄새를 풍기며 삭았다. 어떤 진심은 추해졌고 어떤 진심은 다만 견디는 삶으로 전락했다."
"아직 지우지 못한 문장이 하나 남아 입 속을 맴돌았다. 이젠 누구도 진심이 아닌 곳에 왜 열매들만이, 오직 열매들만이 진심인 채로 남아있을까."
한 때 진심에 매료되었던 이들은 이제 진심을 망각하고 진심의 형식에만 노련해지고, 이제 그 진심의 장에 포획된 다른 사람들이 진심의 주술사로 변모해 간다.
·
그런 진심은 예외적인 걸까? 가스라이팅과 세뇌가 체질화된 어떤 사이비 종교단체에서나 있음직한 일로 읽으면 안보윤의 '어떤 진심'에 대한 단편적 독해일 것이다. 가정에서도, 조직에서도, 여러 관계들 속에서도 그런 진심은 번식하고 있다. ‘어떤 진심’의 특징은 이기적일 뿐 아니라 타자를 통제하고 조종하려 든다는 점이다.
'어떤 진심'과 같은 진심이 어디 소설 속에만 존재할까? 우리 일상과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진심들의 서사에 진저머리치고 있지 않는가. 권력자와 정치인들의 단호한 얼굴과 찬란한 약속들 속에서, 전쟁터의 사령관들과 그 진심에 눈물 흘리는 병사들에게서, 온갖 인터뷰나 영상 콘텐츠에서 우리는 진심이라는 천박한 키치를 쉬 목격한다. 슬프게도 어떤 진심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잘 먹혀든다. 게다가 우리의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대화와 다툼, 거래들 속에서도 진심의 마법은 효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 사랑, 부탁, 약속, 노력이란 말이 널리 유통되고 연출된다.
소설 속 화자의 독백은 다소 허무주의적이다. 통조림의 유통기한이 지났음을 애써 폭로하는 데 그친다. 아직 고장난 진심의 회로를 다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야 하고, 보다 깊이 인식하여 완전히 탈주해야 하지 않을까. 진심이라는 언어와 표정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관계의 수평적 배치일 것이다.
그럴싸한 통조림을 보면 역겨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을 지녀야 한다. 나아가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매 순간 '나의 진심'을 넘어서야 한다. 그 질문은 단순하다. ‘이 관계 안에서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